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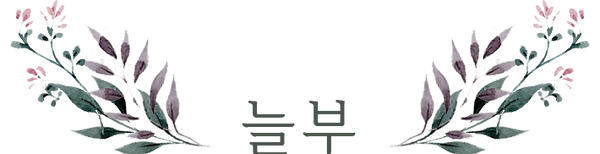
꽃 피는 봄은 언제
Original Story
노이즈 x 에러
온 세상이 수줍음 타는 소녀의 볼마냥 연분홍빛으로 화사하게 흐드러졌다. 황사가 어쩌고, 미세먼지가 어쩌고 하는 얘기로 시끌시끌한 와중에도 꽃구경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쌍쌍이 짝을 이루어 벚꽃 핀 길을 거닐었다. 설렘이 묻어나는 발걸음은 가볍고 웃음이 곁들여진 목소리는 달콤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한 소녀도 마찬가지였다. 다정한 연인들 사이 혼자 걷고 있다는 것만이 그나마 특이하다고 말할 만한 요소였지만, 잔뜩 들뜬 표정은 어색함 하나 없이 이 완연한 봄에 완벽하게 잘 어울렸다. 한 쪽 귀에만 낀 이어폰이 달랑거렸다. 이어폰에 대고 조잘조잘 떠드는 소녀는 아무래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벚나무 아래 홀로 선 소녀의 옆자리를 채워주러 올 듯한 누군가와.
“와, 여기 사람 진짜 많아! 역시 벚꽃으로 유명한 데라서 그런가 봐.”
등을 기대고 서 있던 나무 아래도 소녀와 상대가 만나기로 약속한 곳은 아니었는지, 소녀는 잠시 멈췄던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어디를 향해 걷는 걸까. 그런 걸 읽어낼 수 없을 정도로 느긋한 발걸음이었다. 한 발짝, 한 발짝. 가볍고 느린. 어쩌면 아무 의미도 실려있지 않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천천히 걸어가는 소녀의 팔이 달콤한 공기에서 헤엄치듯 나풀거렸다.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녀는 계속 재잘거리고 있었다. 온통 새까만 후드 위로 늘어진 하얀 이어폰 줄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래서, 언제 올 거야? 같이 꽃구경하고 싶은데.”
어디까지나 가벼운 질문이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아직 오고 있는 상대방에게 던질 법한, 그런 평범한 질문. 소녀의 말투는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상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소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은 얼굴 그대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수면처럼 잔잔한 표정이었지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내 왈칵 넘쳐흐르고 말 것 같이 보였던 건 기분 탓일까.
바람에 휩쓸린 벚꽃잎이 날아올랐다 팔랑팔랑 떨어지며 시야에 꽃무늬를 수놓았다. 귀 뒤로 넘기기도 애매한 짧은 머리카락이 볼을 간질였다. 그저 그 정도뿐인, 모서리를 둥글린 부드러운 바람이었지만, 소녀는 그 바람에도 어깨를 움츠리며 작게 떨었다. 까만 머리카락에 까만 옷. 부슬거리던 웃음마저 잃어버리고 새까맣기만 한 소녀는 봄의 한가운데에서 오려낸 듯 붕 떠 있었다. 고개를 숙여 얼굴도 숨기고, 푹 눌러쓴 후드 아래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겨우 기어나왔다.
“언제 올 거야, 에러?”
소녀는 같은 말을 또다시 내뱉었다. 전화 너머의 상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연인의 손 대신 손 안에 꼭 쥐고 있던 핸드폰 화면은 소녀가 말한 그대로의 이름을 비추고 있었다. 에러. 소녀와 함께 자라나 어느 순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버리고 만 소꿉동무의 이름. 그리고 어느 날 평소와 같은 웃음을 마지막으로 홀연히 사라져 버린 주인 잃은 이름. 소녀가 찾아 헤매는 이름. 그리고.
“노이즈, 나 여기 있잖아. 난 에러야.”
소녀가 만들어낸 가짜 프로그램의 이름. 자신이 원하는 말을 그대로 들려주는 익숙한 목소리를 그냥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이즈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부정했다. 넌 만든 것부터가 내 실수였어. 가장 크나큰 에러. 화면을 가득 채우는 붉은 경고창.
“아니잖아.”
“난 네가 만든, 널 위해 만든, 네가 바라는 대로 만든 에러야.”
“아니잖, 아! 에러는 나,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 항상 제멋대로, 제멋대로에 결국 내가 바라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 멋대로 지껄이고 멋대로 웃어주고 멋대로 떠나 버리고 왜 돌아오지 않아? 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거야!”
아직도 눈앞에 선연하다. 꽃잎을 닮은 분홍빛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져 이따금 깜빡이는 칙칙한 싸구려 형광등 아래서 희미한 빛만을 뿌리던 것이 안쓰러웠다. 작은 소녀 둘이 쪽잠을 자러 웅크려 누우면 가득 차는 좁아터진 방에서 두 사람은 손가락을 엮었다. 나란히 앉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함께 보러가기로 약속했었다. 별도, 꽃도, 지금껏 보아오지 못했던 것 모두를.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는 컴퓨터의 누리끼리한 화면으로도 벚꽃은 왜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노이즈는 벚꽃 아래서 에러의 손을 잡고, 어쩌면 그 너머까지 나아갈지도 모르는 깜찍한 상상을 하며 조용히 볼을 붉히곤 했다. 언제 갈까? 다음 봄에.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었다.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파.”
지직거리는 노이즈에 섞여, 작은 목소리가 들려온 듯 했다.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단 한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제 신세를 털어놓는 하소연일까. 프로그래밍된 대로 지금 소녀가 가장 듣고 싶어할 말을 건네는 위로일까. 노이즈는 자신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신이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해 보았자,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 돌려주는 말은 독백이나 다름없었다. 결국은 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진짜 에러는 대체 언제 돌아와 주는 걸까. 약속은 언제가 되어야 지킬 수 있는 걸까. 함께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손 안에 남은 거라곤 조악한 솜씨로 제 추잡한 욕망을 그러모아 빚어낸 텅 빈 허물이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 한가운데서, 노이즈는 아직도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